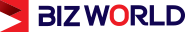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48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2.10시간에 달했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의 1주일 평균 휴대폰 이용시간은 36시간을 넘겼다.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장식 방법은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여성들의 경우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아름다운 모양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선호하는데 이들은 휴대폰 최초 구입 후 교체 때까지 평균 2.4개의 케이스를 교환한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 20%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함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같은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납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식욕 부진을 비롯해 빈혈과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에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수 감소, 유산 등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5개 제품은 모두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검출됐다.
문제는 최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드러난 허술한 중금속 기준과 마찬가지로 핸드폰 케이스도 유해물질 안전기준 없응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한 개도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한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